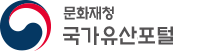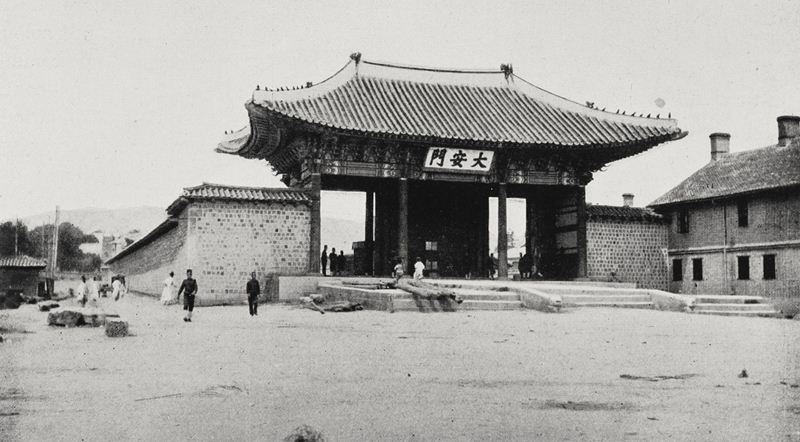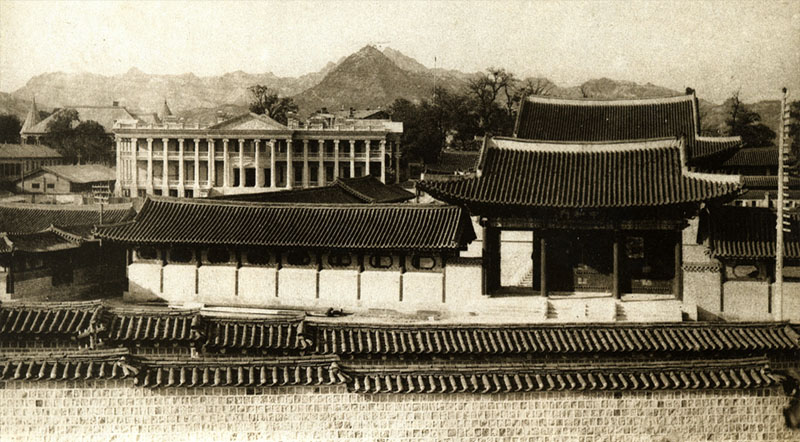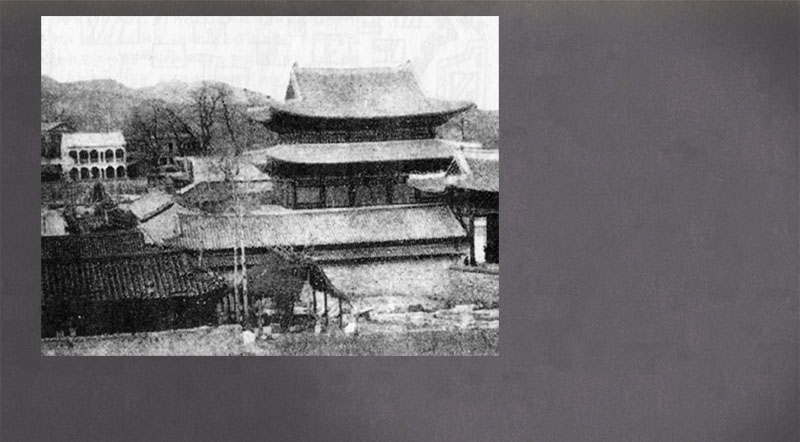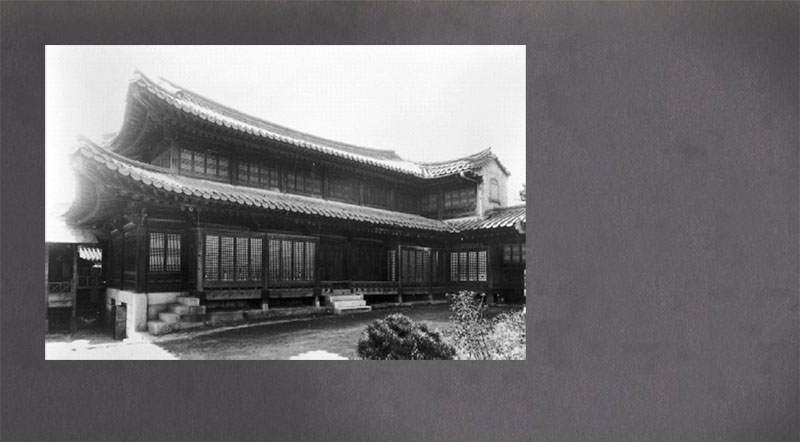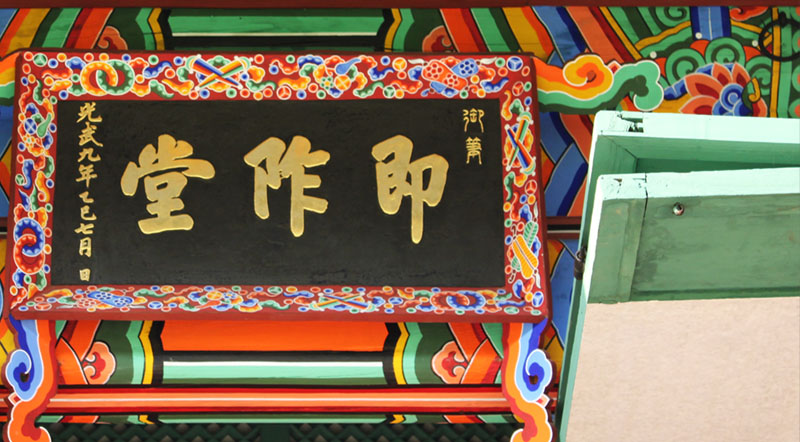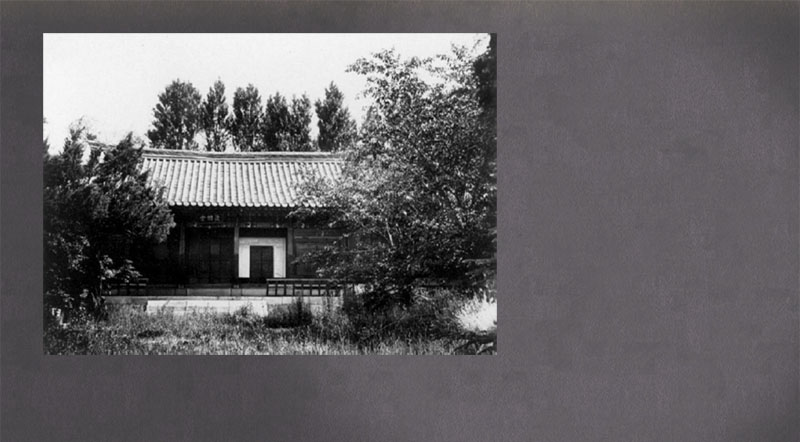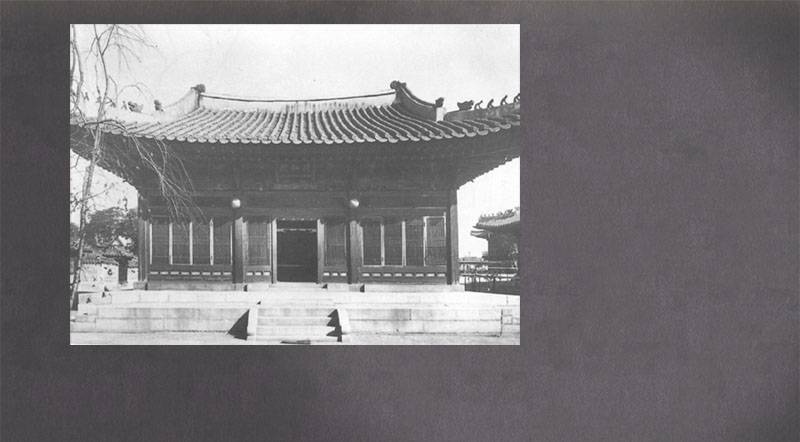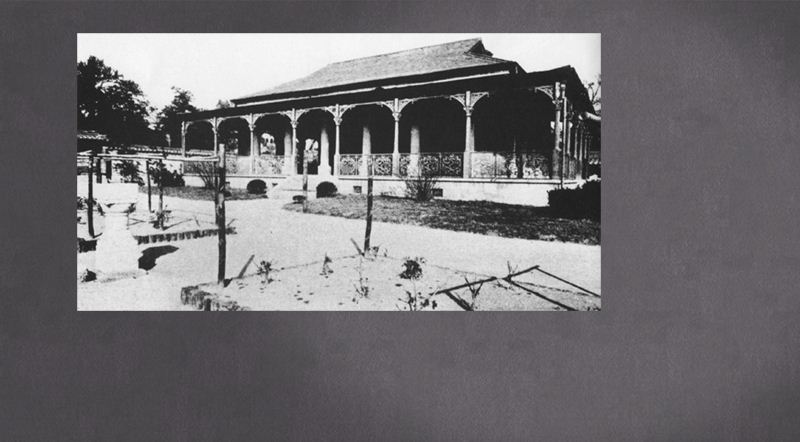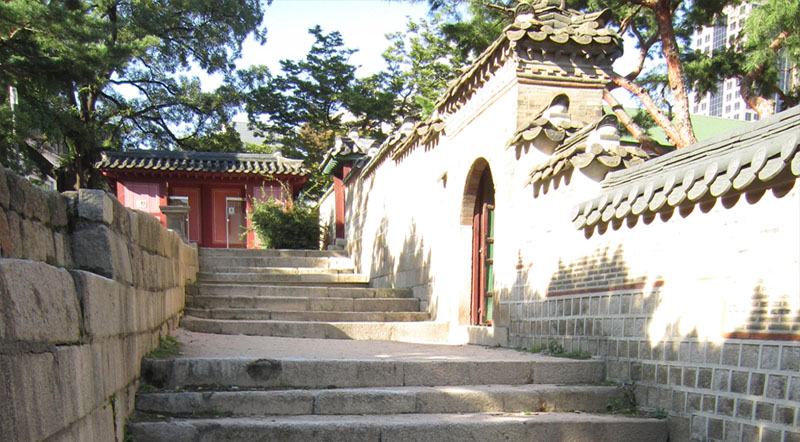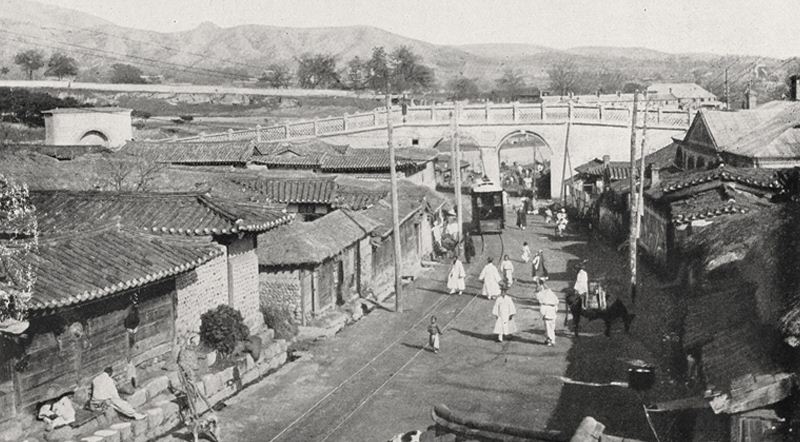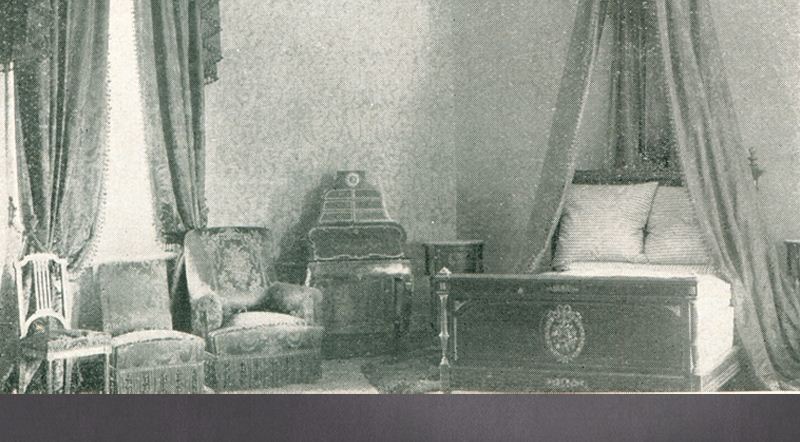본문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8-11층, 2동 14층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 ☎ 1600-0064 (유료)

ⓒ 2000. KOREA HERITAGE SERVIC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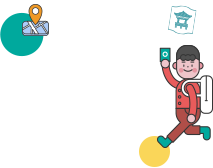
 국가유산
국가유산방문 인증하고
스탬프를
모아보세요!
- 자주찾는 메뉴설정
- 내가 검색한 국가유산
-
자주찾는 메뉴 설정
- 국가유산 검색
- 궁궐·종묘
- 조선왕릉
- 기록유산
- 유네스코 등재유산
- 국가유산청 사진관
-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