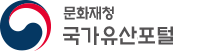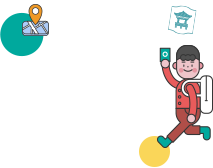관인의주조
관인의 주조는 대개 이· 호· 예· 병· 형· 공 등의 각조에서 임금에 아뢰어, 상서원에서 어보의궤율(御寶儀軌律)이나 전례에 따라 주조하였다. 지방관의 경우는 해당 각조(各曹)에서 임금에 계(啓)하여 인신을 주조하였다. 평안도 도절제사인의 경우도 병조에서 임금에 계하여 주조하여 보냈다. 그러나 수령이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사용하는 인장은 각 관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인장(印匠)은 적당한 인재가 선택되면 인전(印篆)의 인문(印文)을 구상하여 인고(印稿)를 작성한다. 인장(印匠)의 예우는 무명이나 포목을 주었는데, ‘개인예목(改印禮木)’은 각 관아의 인장을 개조할 때 인재 , 조각 , 기타 수수료 등을 합한 사례조의 무명이고, ‘개인작목(改印作木)’은 인신(印信)을 고쳐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돈 대신 받는 포목으로써 인장 제작의 수고료를 포목이나 무명으로 주었다.
군(郡)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예조에서 임금에게 계하여 다른 군의 예에 의하여 인을 주조하여 보냈다. 또 관제 개편에 따라 인신을 다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주조가 늦어질 경우 경외(京外)의 인신은 아직 예전 인을 쓰되 새로운 인을 만들기를 기다려 사용할 것이며, 그 처음 사용하는 날과 달을 각각 그 관사에서 치부하여 그대로 본조에 보내 등록하여 후일에 빙고할 수 있게 하였다. 수령이 갑자기 죽거나 변고가 있어서 위조문서의 의심이 있을 경우도 새로 인신을 만들어 보냈다.
관인의 규격
관인의 규격은 태종 때 여러 관부의 인장 규격을 다시 정하였다. 태종 3년(1403) 예조에서 여러 관부의 인신제도를 정할 것을 신청하였다. 왕과 중서문하의 인은 방(方)이 2촌 1푼(6.02㎝), 추밀(樞密)·선휘(宣徽)·삼사(三司)·상서성(尙書省) 등 제사(諸司)의 인은 방(方) 2촌(5.73㎝), 절제사(節制使 : 3품)는 1촌 9푼(5.44㎝), 나머지 인은 모두 1촌 8푼(5.16㎝), 경성(京城) 및 외직사(外職司) ·논교(論校) 등의 인은 길이가 1촌 7푼(4.88㎝), 너비가 1촌 6푼(4.58㎝), 본국의 1품 아문은 중조의 추밀(樞密)의 예에 의하여 그 인이 방 2촌(5.73㎝), 2품아문은 1촌 9푼(5.44㎝), 3품아문은 1촌 8푼(5.16㎝), 4품아문은 1촌 7푼(4.88㎝), 5품아문은 1촌 6푼(4.58㎝)이고, 참외아문(參外衙門)은 1촌 5푼(4.3㎝)으로, 즉 1품 아문 방 2寸(5.73㎝), 2品 아문 1寸 9푼(5.44㎝), 3품 아문 1寸 8푼(5.16㎝), 4품 아문 1寸 7푼(4.88㎝), 5·6품 아문 1촌 6푼(4.58㎝), 7品 이하 아문 1촌 5푼(4.3㎝)으로 하되 그 촌·푼은 예기척(禮器尺)에 의하였다.